-
이야기 둘. 여주 人
고된 언덕 넘어왔어도
강천면민 김화자
행복한 내 인생1945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난 김화자 씨는 6·25전쟁 후 원주로 이주해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도전3리에
구성 이현주(편집실) 사진 제공 여주세종문화재단
정착했다. 그는 결혼 이후 도전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 누에치기, 담배 농사 등을 하며 억척스럽게 가족을
부양한 그는 담배 농사를 끝내고 도전리 식당을 차렸다. 담배 밑에 심었던 메밀로 메밀묵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되어 도전리 식당은 메밀묵으로 유명해졌고, TV에 소개되기도 했다.
-
 강천면민 김화자
강천면민 김화자
-
 처음 얼굴을 본 신랑과 찍은 약혼 사진
처음 얼굴을 본 신랑과 찍은 약혼 사진
젊을 땐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김화자 씨는 21살 때부터 여주에서 살았다. 원래 고향은 단양 영춘면. 6살 때 6·25 전쟁이 나서 여기저기 피란을 다니다 먼저 원주에 정착했다. 다섯 남매였는데 큰오빠는 의용군에 끌려가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언니는 결혼했고, 원주에 취직한 형부가 원주가 살기 좋다 해서 김화자 씨 어머니가 남매들을 데리고 원주로 이사를 했다.
“원주 판부면, 거기 뒤에는 비행장이 있었어요. 그 옆에다가 하꼬방(판자집)을 지었어요. 그때는 살기가 너무 막막했으니까. 치악산에 가서 오빠들하고 나무를 해다 밥만 익혀서 먹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군불이라는 거는 모르고, 옹기종기 모여서 자고. 오빠 둘은 나보다 두 살, 다섯 살 위인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빠는 냇가 옆 공터에 군인들이 세차하러 오면 대신 차를 닦아주고 쌀을 얻었어요. 자기들이 닦아야 되는데 손 시려우니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오빠들이 차 닦고 쌀 얻어먹었다는 게.”전쟁 후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던 김화자 씨는 17살에 두부 공장에 취직했다. 덕분에 두부나 비지도 얻을 수 있었고 월급을 받으면 쌀을 반 가마 정도는 살 수 있어 생계에 보탬을 줄 수 있었다. 그러다 어느덧 그도 시집갈 때가 됐다.
“근데 21살이 되니까 시집갈 때가 됐잖아요. 그때 내가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생각하실 때 여기에서 시집보내면 까딱하면 남의 첩으로 갈까 봐 안 되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 하나 좋다는 거, 괜찮다는 것만 알지. 그때 옆집에 살던 사람이 군화, 옷, 코트 같은 거 팔고 그랬어요. 그때 물건 떼러 왔던 이가 나를 보고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 싶어서 오빠가 장가를 안 가고 둘 있어도 중매를 선 거예요. 그냥 엄마가 그 사람 말을 딱 믿고 양반이고, 고지식하다 그러니까 승낙을 했어요. 신랑을 좀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바깥양반이 이십 리를 고개를 걸어서 넘어왔어요.”
 두부 공장 직원들과 함께(맨 오른쪽)
두부 공장 직원들과 함께(맨 오른쪽)
처음 본 날 약혼, 참 옛날이야기 같죠
방 하나에 살던 시절, 미닫이문을 열고 김화자 씨는 장래 신랑의 얼굴을 봤다. 말하자면 선이었다. 한 10분 정도 있었을까? 그 짧은 만남으로 두 사람은 약혼을 했다.
“신랑 되는 사람보고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좋아요’ 이랬어. 그리고 나한테 ‘넌 어떠냐?’고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못 했지. 그랬더니 ‘됐다’ 이래서, 단구동 그 앞에 가면 사진관 새로 생긴 데가 있었어요. 사진 찍자고, 약혼 사진을 딱 두 장 찍어버린 거예요. 처음 본 날, 참 옛날얘기 같죠. 약혼 사진을 찍으면 그게 약혼식이 되는 거야. 빵집에 가서 빵도 하나 먹고. 뭐 그때는 짜장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몰라도 빵집이 유행이었어요.”
약혼 예물은 화장품 한 갑. 한 달 뒤 김화자 씨는 도전리로 시집왔다. 산 고개 외딴집, 시부모와 시조부모까지 있는 집이었다.
“결혼식은 시집에서 족두리 쓰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죠. 양동에나 사진관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결혼식 사진 찍고 다 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는 아들 하나라고, 소 팔아서 금반지 하나, 시계 하나 해주고, 반짝이 옷 그때 처음 나왔댔어요. 그것도 다 해줬어요. 그렇게 잘 해줬어요.”
시댁에서는 김화자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시댁 소유는 아니었지만 약 6,600~9,900m²(2,000~3,000평) 되는 밭에 밀보리를 심어 여름에는 국수, 보리밥을 해 먹어 배는 곯지 않았다. 여름에는 아침, 점심으로 꽁보리밥을 먹고, 저녁에는 국수를 먹었다. 결혼했으니 이제 혼인신고도 해야 할 터. 그런데 김화자 씨는 혼인신고를 하려다 기막힌 경험을 했다.
“결혼할 때 동네 사람이 와서 보더니 다 수군거리는 거야. ‘짝이 기울어서 못 산다고, 어떻게 저런 색시가 와서 사냐’면서.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부러워서 저런 며느리 봤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기도 했나 봐. 그렇게 내가 이런 데로 시집을 왔으니까, 이 집에서 겁이 나니까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만에 서둘러서 혼인신고를 하더라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세상에 웬걸. 우리 신랑이 여자로 돼 있는 거요. 옛날에나 나올 얘기지.”
사연인즉슨 이랬다. 김화자 씨 신랑이 태어나자 시아버지가 동네 구장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했다. 그런데 구장이 김화자 씨 신랑을 여자로 신고한 것이다. 서류상으로 여자끼리 혼인신고가 될 리 만무했다. 지금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만, 당시로선 최고의 선택이 사망신고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장이 사망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을 사망신고를 했어요. 그때는 면사무소하고만 이야기만 잘하면 됐나 봐. 그래서 구장 말이면 돼가지고 했지. 사망신고를 하고 우리 남편이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도전리 식당은 메밀묵과 백숙으로 유명하다.
도전리 식당은 메밀묵과 백숙으로 유명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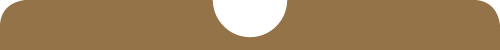
*김화자 씨 이야기는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총서, 《여주를 담다 삶을 기록하다》 강천면민 편에서 발췌·수록했습니다.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은 여주 시민의 생활과 삶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잊혀가는 여주의 기억과 모습을 기록하고자 기획됐습니다.
-
끼니때마다 밥상을 세 개씩 차렸어요
그렇게 기막힌 과정을 거쳐 혼인신고를 하고 김화자 씨의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댁 식구들은 ‘양반 집안’이었다. 가족들은 항상 하얀 저고리에 바지를 입어 빨래를 쌓아놓았고, 시아버지는 꽁보리밥이 싫다고 하루 세끼 국수를 달라고 하셨다. 밥상은 끼니때마다 따로 세 개씩이나 차려야 했다. 그렇게 살며 김화자 씨는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낳았다.
“아기 낳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포대기 하나 하고 기저귀 하라고 소창 반 필을 사 왔어요. 근데 소창은 두고 아껴서 친정에 갈 때나 그거를 쓰고 광목 자루, 옛날에는 그거를 사다가 잿물에 삶아가지고 자꾸 씻고 볕에다 놓으면 다 바래져. 기저귀가 때깔이 왜 안 나느냐면 잿물을 사다가 쌀겨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요. 그거를 가지고 빨래를 하면 때는 잘 가요. 근데 색깔이 뽀얗지가 않아. 누리퀴퀴해. 또 시할아버지가 하얀 바지저고리를 입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보수적이라 검은 바지를 안 입어요. 꼭 흰 바지만 입고. 논에 갈 때도 입고 나가고, 그렇게 입다 보니 옷을 기워서 입게 되잖아. 중의적삼 같은 거 기워서. 그렇게 쪼갠 거 가지고 요령껏 잘라서 기저귀를 만들어 입혔어. 엄마가 사다 준 거는 아끼다가 어디 갈 때만 쓰고. 우리 엄마가 내가 어떻게 사나 보러 왔다가 아주 후회를 하시는 거야. 괜히 이리로 시집보냈다고. 맨날 빨래만 하고 고생만 하니까. 군인 가족은 나이아가라 치마저고리 입고 뽀얗게 잘 다녔는데. 나는 일만 하니까 아주 보기가 안쓰러웠던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올 때마다 울었다는 거야.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는 도전리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김화자 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는 도전리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김화자 씨
일, 즐기며 살면 돼요!
김화자 씨는 억척같이 살았다. 그러다 시댁에서 분가해 마을로 내려오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에를 치기 시작했다. 누에를 치면서 땅도 사 모았다. 누에가 시들해지자 담배 농사를 시작했다. ‘양반’인 남편은 천식 기가 있어 힘든 일은 할 수 없었다. 그래도 힘을 쓰지 않는 일에는 도움을 주었다. 담배 농사를 접고 식당을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돈 모으는 재미에 몸 아픈 줄도 몰랐다. 식당이 잘돼 나중에 부부가 편안하게 살려고 한옥도 새로 지었다. 그러나 남편은 좋은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남편 대신 도전리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다. 김화자 씨는 이야기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래서 일을 즐기며 살면 된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은 작은 재산이고, 건강은 큰 재산이다. 이 좋은 세월 잘 살아야 될 텐데 몸이 아파 병들면 그건 네 몫이지 딴 사람 몫이 아니다. 누구든지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를 위해 살라고, 아끼지 말고, 자기 몸이랑 건강을 위해서 살라고, 아등바등한다고 돈 모아주는 거 아니라고, 그 말은 해주고 싶어. 젊은 사람에게 좀 도움 되는 말해주고 싶은데, 나 자신을 위해 한마디 해봤어요.”
2015년 식당을 며느리에 물려준 그는 지금도 식당 일을 돕고 농사를 지으며 일을 쉬지 않는다. 힘들게 긴 세월을 지나왔지만 김화자 씨의 표정에는 그늘이 없다. 마음이 누구보다 넉넉한 부자여서가 아닐까?